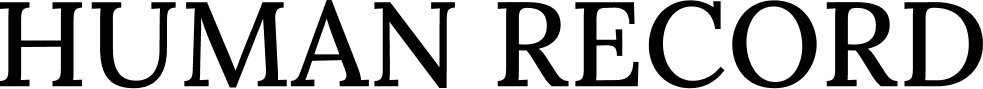Susan Sontag
나는 해석에 반대한다

by modern promenader
수전 손택에 대하여
수전 손택 (Susan Sontag, 1933–2004)은 비평가, 소설가, 그리고 20세기 지성계를 대표한 사유의 아이콘. 1960년대 지성계에서 손택은 문학, 예술, 철학, 정치 전반을 가로지르는 에세이로 시대의 감각을 뒤흔들었다. 그녀의 글은 언제나 ‘사유의 온도’를 지녔다 날카롭지만 뜨겁고, 논리적이면서도 육체적이었다.
대표작인 『해석에 반하여』에서 손택은 “해석은 지성이 예술에 가하는 복수다”라 선언하며, 과잉된 의미 해석에 맞서 감각과 형식의 회복을 요구했다. 그녀의 비평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세계를 더 생생하게 느끼려는 태도의 철학이었다.
“해석은 작품을 길들인다.”
우리는 작품을 마주할 때마다 그 속에서 메시지를 찾아내려 한다. ‘이건 무엇을 말하나?’라는 질문이 감각보다 먼저 튀어나오고, 이해하려는 욕망이 느끼려는 감각을 덮어버린다. 낯선 것을 해석으로 통제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본질을 느끼는 힘을 잃는다.
손택은 이 지점에서 묻는다. 왜 우리는 예술 앞에서 그토록 ‘이해’에 집착하는가? 예술이 반드시 어떤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는 강박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오늘은 이 ‘해석의 강박’의 기원을 따라가며, 손택이 제시한 사유의 궤적 그리고 그녀가 말한 ‘해석 이후의 세계’, 다시 감각으로 돌아가는 길을 함께 더듬어보고자 한다.
플라톤에서 손택까지
예술을 해석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아주 오래된 일이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은 예술을 ‘모방의 모방’이라 불렀다. 현실 자체가 이미 이데아의 그림자라면, 예술은 그림자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는 예술이 진리로부터 두 번 멀어진다고 말하며, 그것이 인간을 진리에서 더욱 떨어뜨린다고 우려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의 효용을 옹호했지만, 여전히 그것을 현실의 재현 곧 내용의 전달로 이해했다. 이런 인식은 이후 서양 예술관의 근간이 되었다. 예술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무엇을 말하느냐의 문제로 환원되었고, 우리는 언제나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는 관습에 익숙해졌다. 손택이 지적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예술은 언제나 해석되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작품을 감상하기보다 해독하려 드는 습관을 길러왔다. 그 결과 예술의 생생한 감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해석의 폭력, 이면을 파헤치는 습관
프로이트와 마르크스의 등장은 예술에 새로운 분석의 언어를 부여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예술을 다시 ‘숨은 의미의 보고’로 만들었다. 프로이트는 꿈과 예술, 언어의 실수를 잠재의식의 표현으로 읽어내며 ‘드러난 내용’과 ‘숨은 내용’을 구분했다.
마르크스는 사회적 현상 속에서 억압된 구조의 징후를 포착하려 했다. 이렇게 예술은 늘 ‘표면 아래 무언가’를 품은 존재가 되었고, 비평의 목적은 그것을 파헤치는 일이 되었다. 손택이 보기에 이는 일종의 폭력이다. 작품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지 못하고, 늘 해석자의 칼날 아래 놓인다. 우리는 감각 대신 분석을, 경험 대신 개념을 선택했고, 예술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해독해야 하는 텍스트가 되어버렸다. 손택은 이를 “지성이 예술에 가하는 복수”라 불렀다.
형식의 귀환, 보는 언어의 회복
손택은 이 복수의 사슬을 끊어내고자 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한다.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보라.” 그림의 선, 영화의 리듬, 문장의 호흡 이 모든 것이 작품의 언어다. 형식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다. 그것은 감각이 사유로 번역되기 전, 예술이 세상과 맞닿는 가장 원초적인 방식이다.
손택에게 ‘형식’이란 곧 예술의 숨결, 그 자체로 의미를 생성하는 감각의 질서였다. 우리는 작품의 메시지를 해석하기보다, 그 형식이 만들어내는 리듬과 구조, 빛과 온도, 템포와 여백을 감각해야 한다. 비평의 임무는 ‘무엇을 말하나’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술은 문장처럼 읽히는 게 아니라, 빛처럼 느껴져야 한다.
투명성의 윤리, 영화의 사례
손택은 이러한 태도를 ‘투명성의 윤리’라 불렀다. 해석은 사물을 의미의 그물 속에 가두지만, 투명성은 그 그물 바깥에서 세계를 다시 느끼게 한다. 그녀는 이를 영화에서 가장 잘 발견했다. 오즈 야스지로의 카메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의 빛을 그대로 통과시킨다. 브레송은 인물의 감정보다 손의 움직임을, 르누아르는 인물보다 공기의 리듬을 포착한다. 이들은 모두 해석을 걷어내고, 감각이 스스로 말하게 한다. 투명성은 의미의 부재가 아니라, 감각의 회복이다. 해석이 사물을 불투명하게 만든다면, 투명성은 다시 빛을 통과시킨다. 손택에게 예술의 윤리는 바로 그 빛의 통과에 있었다.
성애학의 제안, 감각의 복원
손택은 마지막에 이렇게 단언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석학이 아니라 예술의 성애학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애학’이란, 단순한 감각의 찬미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와 다시 접촉하는 법, 감각의 언어를 회복하는 윤리다. 그녀가 말하는 예술의 성애학은 ‘사유의 부정’이 아니라 ‘사유 이전의 감각’을 되찾는 시도다. 우리는 작품을 이해하려는 대신, 그 앞에서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손택이 말하는 감각의 회복은 단순히 예술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방식에 대한 제안이기도 하다. 보는 법, 듣는 법, 느끼는 법을 다시 배우는 일, 이것이 그녀가 말한 새로운 비평의 출발점이다.
마치며: 다시, 감각으로 돌아가라
세계는 이미 의미로 포화되어 있다. 모든 것이 설명되고, 분석되고, 정의된다. 그러나 예술은 설명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 손택은 말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더 많이 느끼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우리는 이해보다 접촉이, 해석보다 체험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예술은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다시 일깨운다. 그것은 세계를 새로 읽는 것이 아니라, 새로 ‘보는’ 일이다. 손택이 말한 ‘해석 이후의 세계’는 바로 이 지점—감각이 다시 주권을 회복하는 자리다. 해석의 언어로는 닿을 수 없는 세계,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